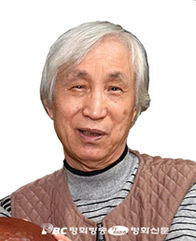
어릴 때 탁발스님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절에 가면 마치 고향마을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 옛날 대문 밖에서 목탁소리가 들려오면 할머니가 바가지에다 쌀을 퍼서 얼른 나가셨다.
무슨 날인지 모른다. 일 년에 몇 차례 시루떡을 해놓고 우리 할머니는 두 손을 비비며 “우리 손자 잘되게 하여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내가 조금 커서 중학교에 가고 이른바 신학문이란 걸 하면서 그런 건 다 미신이라고 그랬다.
과학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면 다 미신이라 하고 무시하였다. 신시대 사람으로 어떤 우월감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미신으로 덮어버릴 일은 아닐 것 같다. 세상은 넓은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강에 모래알 하나뿐이나 될까. 그것을 이즈음에 와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60년대 전반까지이던가 라틴어로 미사를 하였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예식이니까 그러려니 했다. 그러던 일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말 미사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것도 좀 이상하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 싶다.
우리말 미사가 시작됐을 무렵에 지어진 성당이 서울 새남터성당이다. 다들 저런 성당이 다 있나 그랬다. 우리 교회 안에서 토착화란 말이 번지기 시작하였다. 제의를 한국 두루마기로 한다느니 아리랑을 성가로 한다느니 국악미사가 되는 것도 다 그런 연유에서였다.
토착화 바람은 상당히 오래 갔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뾰족 성당 말고 우리 건축가들이 자유롭게 성당을 설계하는 시대가 되었다.
성모상 수난 시대가 있었다. 성모님이 한국사람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70년대 언제쯤 있었던 일이다. 어떤 친구가 성모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리에 놓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성모님은 이렇게 안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물었더니 성물가게에 있는 성상을 갖고 와서 이렇게 생겼다 했대서 우리가 웃었다. 웃기는 했지만 슬픈 일이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지도 60년이 넘었다. 그런데 성당생활이 어색하지 않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것 같지가 않다. 외래 풍속에 적응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방이란 것을 맞았다. 1945년 그해 여름 8월 15일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우리 집 앞에는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그 그늘아래 다 모여 있었는데 다들 하아얀 무명바지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양복바지 입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양복이란 말 자체도 없어졌다 할 만큼 국제화라 할지 의복혁명이 생긴 것이다. 그러는 데 100년이 걸렸다. 세상은 잠시도 쉴 새 없이 변화한다.
일만 년을 각각 살아온 동양과 서양이 만나서 융화하는데 그게 금방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가. 불교가 원래는 외래 종교였다.
유교도 원래는 외래 종교였다. 「레미제라블」에는 그리스도교의 박애와 연민이, 「심청전」에는 유교의 효사상이 녹아있다. 종교가 현실 속에서 생활화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있으면서도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 종교전쟁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죽고 살기로 다투는 것은 무슨 전쟁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깊은 데에다 그물을 쳐라.” 어디가 깊은 데일까.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