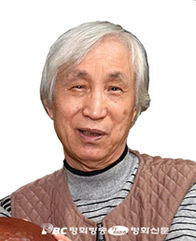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어떤 날 한순간에 결정된 일이었다. 그 옛날 이상하게도 천주교에 대해 뭐하나 아는 게 없었다. 그러던 내가 어쩌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되었나 하는 사정을 뒤돌아보고자 한다.
1957년 대학교 4학년 때 일이다.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9월 학기를 준비하느라 서울역에서 혜화동 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앉아 있는 중에 건너편 건물 벽에 하얀 종이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다.
한문으로 불교사상대강좌(佛敎思想大講座)였다. 필동 근처였다. 그게 눈에 번쩍 들어왔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이다. 불교라는 단어가 왜 내 가슴을 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벽만 바라보고 한참을 더 가다가 포스터를 또 발견했다.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다. ○월 ○일 ○시 지금의 조계사였다.
그날 그 시에 조계사를 찾아갔다. 김범부, 유진오를 비롯해 우리나라 명사들은 다 모인 것 같았다. 법회가 끝나고 광고하기를 비원 앞 대각사(大覺寺)에서 매일저녁 특별강좌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부터 대각사에 갔다. 단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다. 주지 스님이 반야심경을, 동국대 교수가 불교사를, 황산덕 교수가 특강을 했다. 반야심경이 끝나고 금강경 강의를 거의 마칠 무렵 겨울방학이 됐다. 그 이후에 다시는 대각사 강의에 나갈 수 없었다.
이듬해 2월 나는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고향 대전에서 불교당을 찾는다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군데 찾기는 했지만 나 같은 젊은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고서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까지 찾아서 대전 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그렇지만 다 적응하지 못했다.
의기와 패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나는 무언가 크게 목말라 있었다. 하루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그 친구는 싱겁게도 “그래? 가자!”고 했다.
내가 이끌려 간 곳이 대전 대흥동성당이었고 거기서 오기선 신부님을 만났다. 만나자마자 나는 요한 세례자 같은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 신부님은 시원한 성격이었다. 그 순간에 나는 다 내려놓았다.
얼마 지나서 성탄 무렵에 나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을 무엇이라 할까요?” 지나가는 말로 신부님께 물었다. “요셉이지!”라고 하셨다. 나는 ‘프란치스코’라 정해놓고 있었던 참인데 요셉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다.
희한한 감격이 있었다. 추운 겨울 10리나 되는 성당 길을 걸어서 새벽미사에 다녔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냥 홀가분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었다.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런 어림도 없는 생각을 언제까지였던가, ‘그게 아니다’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세월이 필요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불경 공부를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다. 하숙집 같은 방 친구의 책상 위에는 항상 성경이 놓여 있었다. 어떤 날 웬일인지 그 성경에 눈이 갔다.
아무 곳이나 펼쳐 봤다. 책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히는 것이었다. 뜻으로 읽혔다. 하루 저녁에 성경을 다 읽었다 할만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불경을 공부했는데 어째서 성경이 줄줄 읽혔는지, 세월이 가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어떤 날 법정 스님을 만났다. 스님께 물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최 선생이 그때 경을 읽는 눈이 열렸다.” 그렇다! 묵은 숙제가 단칼에 풀린 것이다. 실로 40년 만에 생긴 쾌사가 아니던가. 그것은 이해의 차원을 넘는 어떤 신기한 현상이었다.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