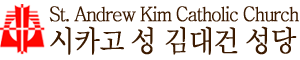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거의 자동적으로 떠올릴 경우가 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이 우리의 마음에 일종의 그림을 그려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그것을 바꿀 이유가 없는 한, 우리는 그 이미지로 그 사람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허허롭던 뒷모습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다정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거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내가 성당을 생각하면 너그러움을 떠올리는 것도 같은 이치에서다.
그렇다. 성당은 내게 너그러운 이미지로 다가온다. 구체적인 경험 때문이다. 5년 전,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당에 나갔다. 어머니가 다니는 지곡성당이었다. 비록 신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어머니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사에 관련된 모든 것이 내게는 낯설기만 했다. 분위기도 낯설고 사용하는 어휘도 낯설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몸짓도 낯설었다. 이질적인 환경에 처할 때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는 그 낯설음을 주시하고 있었다. 일종의 관찰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라는 기도 말이 갑자기 내 마음을 파고들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해달라고 기도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교회와 관련이 없는 ‘그들’까지 기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다니,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타적이고 숭고한 몸짓이 또 있을까 싶었다. 나는 감격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울었다. 그 눈부신 너그러움이 나를 울게 만들었다. 그것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앙상해진 몸으로 마지막 1년을 힘겹게 살다 가신 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 또한 그것은 벼락처럼 내리친 아버지의 부재를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해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나를 대신하는 기도였다.
그 너그러움이 내 아버지처럼 무신론자였고 불가지론자였던 나를 바꿔놓았다. 누가 권하지 않았어도, 그 기도가 표방하는 너그러움의 공동체, 너그러움의 빛 속으로 나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은 그래서였다. 우선은 그 너그러움에 안기고, 언젠가는 그 너그러움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이처럼 성당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너그러움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어쩌면 그것은 젊은 나이였음에도 뒷모습이 늘 허허롭게만 느껴지던, 하필이면 어버이날에 외국에서 세상을 떠나 부모를 포함하여 그를 알았던 모두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든 나의 조카 훈이의 영혼에게도 건네지는 너그러움일 것이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훈이들에게도 건네지는 너그러움일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망연자실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건네지는 너그러움일 것이다. 조촐해서 더 슬프게 느껴지는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 틈에서 나는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생각하시어….”라는 기도 말을 떠올리며 틈만 나면 성호를 그었다. 생전에 성당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조카의 사진 옆에 내가 갖고 다니던 묵주를 두고 온 것도, 내가 성당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너그러운 이미지 때문이었다.
출처: 가톨릭평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