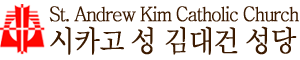언어에 빗대 얘기하자면, 성당에서 행하는 의식이 나에게는 이민자가 마주하는 낯선 나라의 낯선 언어 같았다. 무슨 이유에선가 발을 딛게 된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배우고 익혀야 하는 낯선 언어.
그렇다. 지난 5년을 제외하면 평생을 종교의 울타리 밖에서 살아온 내게 성당의 의식은 일종의 외국어나 다름없었다. 영문학을 하면서 자주 접했던 성경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그만큼 낯설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낯선 것은 기도였다.
미사 시간에 올리는 기도는 공동 기도라서 특별히 고민할 게 없었지만, 혼자서 하는 기도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었다. 물으면 별것을 다 묻는다고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단은 가까운 것부터 기도하자고 생각했다.
나의 입에서 나온 첫 기도는 내 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성당에 나가게 된 나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 기도에 나의 어머니가 말년의 아버지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강박적이지만 내게는 절실한 마음을 얹었다.
그리고 염치없게, 나의 두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도 얹었다. 그런데 누가 알면 어쩌나 싶었다. 너무 이기적이고 상투적이고 초라한 기도 같아서였다. 그래서 더 고민이었다.
기도의 내용을 갖고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다. 영세에 이어서 견진성사를 받기 전날이었다. 성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성당을 막 나서려고 할 때였다. 교리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오더니 밑도 끝도 없이 견진성사 중에 기도를 하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떻게”라고 말하자, 그분은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 하면 돼요”라고 말했다. 거절할 틈도, 내 입장을 설명할 틈도 주지 않았다.
마음이 착잡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 보아도 마땅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매일미사 책에 나오는 기도들을 적당히 응용하면 안 될 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진짜 기도를 하고 싶었다.
가당치 않은 생각이었지만,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싶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고민해도 마지막까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결과로 나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기도를 하고 말았다.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주님, 어떻게 해야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닿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가르쳐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다니,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내가 들어도 한심하고 어린애 같은 기도였다.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런데 얼마 후,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견진성사를 주관하던 주교님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나의 어설픈 기도를 인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법을 모르거나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원론적인 것을 고민해도, 아니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기본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지금도 외국어를 배울 때 제대로 된 발음을 하려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듯,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기도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낯선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민자의 절박한 마음으로.
출처: 가톨릭평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