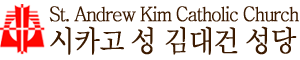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내게는 대사건이었다. 전에는 안 보던 것을 보게 되는 의식의 변화, 이 변화는 정말이지 대사건이었다.
나는 전에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절대자의 존재를 염두에 둔 적이 없었다. 종교를 대화의 주제로 삼은 일은 더더욱 없었다. 애도와 관련된 글을 2년에 걸쳐 문학지에 연재할 때만 해도 애도를 종교와 관련시킨 적이 없었다. 당연히 애도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었다.
구약성서의 ‘욥기’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도 그랬다. 나는 신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욥의 절망과 고뇌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았다. 나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상처였고 인간의 고통이었다. 나는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상처와 고통을 사유하며, 어떻게든 인간 중심적인 글들을 쓰려고 했다. 그러한 글들을 묶은 것이 2012년 5월에 나온 「애도예찬」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3년 1월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내 생각은 시험대에 올랐다. 달리 말하면, 내가 애도에 관한 일련의 글들에서 얘기한 것들이 프로이트가 말한 일종의 ‘현실 검증’을 거치게 되었다.
문제는 애도에 관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운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 넣고 실존의 벼랑에 세웠다. 인간 중심적인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그 상황을 버틸 수 없었다. 이것이 내가 종교를 갖게 된 계기였다.
종교는 내게 대사건이었다. 하나씩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변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혁명적인 사건, 내가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의 글과 말에 절대자에 관한 사유가 조금씩 실리기 시작했다. 딱히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랬다.
마치 오랫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기까지 했다. 내가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문학지에 연재한 글들을 모은 「트라우마와 문학, 그 침묵의 소리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과 복음서를 스스럼없이 인용한 것은 그래서였다. 물론 모든 글들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의식이 처음으로 나의 글에 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의미였고, 그에 따라 이후의 글이 사뭇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전에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사유하고 의미를 찾으려 했던 내가 이제는 어딘가에서 인간을 내려다보고 굽어다보고 가엾이 생각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전에 쓴 글들에 배어 있던 지독한 회의와 고독감이 서서히 물러나면서, 나는 조금씩 평화로워지기 시작했다.
신앙이라는 대사건은 무엇보다도 내게 겸손을 가르쳤다. 이성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성과 논리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지적 오만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신이 욥을 향해 하는 소리를 나를 향한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신앙을 갖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라는 말을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아니 내가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내가 세상에 대해 알면 뭘 그리 많이 알겠는가. “너는 바다의 원천까지 가 보고 심연의 밑바닥을 걸어보았느냐?” 은유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나는 바다를 논하면서도 그것의 원천까지 가 본 적이 없고 그것의 밑바닥을 걸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출처: 가톨릭평화신문